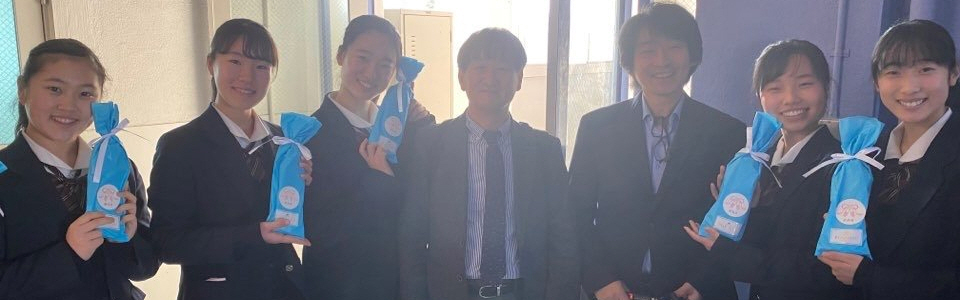지금 도쿄 올림픽이 진행 중이고, 선수들의 휴먼드라마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어쩔 수 없지만, 2년 전부터 악화된 한일 정부의 대립이 올림픽 한일 정상회담 불발로까지 이어지면서 양국 시민들의 올림픽 관람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듯 싶다.
그러나 시민들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불편했던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정부가 대립해도 시민들끼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축하할 것을 축하하고 동정할 것을 동정하곤 했다. 심지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1935년 6월 무용가 최승희는 조선무용 공연을 위해 나고야를 방문했다. 당시에도 일본열도는 올림픽 열기로 뜨거웠고, 나고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까지는 아직 1년 이상 시간이 남았지만, 일본의 축제는 이미 시작되었다. 때마침 1940년 올림픽을 도쿄에 유치했기 때문에 일본 시민들의 자부심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

코로나19와 경제제재 문제로 한일간 여행이 제한되기 직전, 나는 나고야의 아이치현립도서관에서 <주니치(中日)신문>의 전신인 <나고야(名古屋)신문>의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 1935년 6월10일자 신문 7면에 실린 인터뷰 기사였다.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화면의 기사는 활자들이 뭉개지고 사진도 흐릿했지만, 당시 24세인 최승희의 발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최승희는 일본에서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춤이 일본 전통무용이나 근대무용이 아닌, 조선무용이었는데도 일본 시민들은 환영해 주었다. 조선춤 <에헤야 노아라(1933)>를 시작으로 <검무(1934)>와 <승무(1934)>가 최승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있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익명의 기자는 조선의 식민지 상황과 최승희의 춤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최승희의 무용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녀가 유머러스한 교태로 춤출 때 조선이 웃고, 그녀가 쓸쓸하게 춤출 때 조선이 운다.”
최승희를 “민족의 오랜 전통미를 세계에 자랑하는 신시대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조금 의외였다. ‘신시대의 딸’이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었지만, 이 때는 최승희의 인기가 조선과 일본에 머물렀을 때였다. 그런데도 기사는 민족의 전통미를 “세계에 자랑”한다고 썼다.

이 ‘예고’는 현실이 되었다. 최승희는 1년 반 후인 1937년 12월29일 요코하마에서 치치부마루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최승희는 유럽과 남,북미의 세 대륙에서 “민족의 오랜 전통미를 세계에 자랑”했으니 이 기사의 예언은 적중한 셈이다.
기자는 또 이 신진의 조선 무용가를 인터뷰하면서 올림픽 이야기를 곁들였다. 그는 “나도 달리고 싶다”는 최승희의 말을 인용했고, 당시 여성으로서는 장신이었던 5척4촌(=164센티미터)의 큰 키를 지적했고, “달리기를 했으면 올림픽 선수가 됐을 것”이라는 최승희의 들뜬 발언도 이끌어냈다. 이어서 기자가 덧붙였다. “당신은 이미 올림픽 무용가입니다.”
제목을 “민족의 표정”이라고 붙인 이 짧은 기사는 당시의 조선의 식민지 상황과 일본의 올림픽 분위기를 배경으로 전하면서도 최승희의 조선무용의 성격과 예술성도 잘 묘사했다.
이 기사를 읽었던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일본인 시민들은 식민지 상황에서도 조선무용 공연을 쉬지 않는 최승희를 응원했을 것이다.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들도 민족문화를 지켜주는 그녀가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기사에 곁들여진 사진 속의 최승희의 모습은 자연스럽고 역동적이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본 사진은 배경도 흐릿하고 의상도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표정만은 명랑하고 당찬 “조선 아가씨”였다. 혹시 이 사진이 신문사의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 원본을 꼭 보고 싶다.
이 기사는 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독자 중에는 85년 뒤 올림픽에 즈음해서 이 기사를 다시 읽은 나도 포함된다. 그 긴 시간의 흐름을 이겨낸 이런 기사야말로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