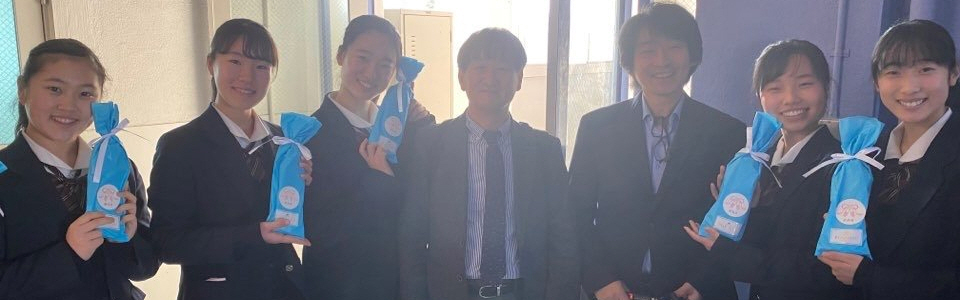앞에서 일제의 국민동원령이 시작된 1938-45년 사이에 약 1백80만명이 군인, 군속, 노무자로 해외로 강제 동원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2천만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거의 10명 중의 1명꼴로 조선 밖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38년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이다. 내가 연고를 찾고자하는 윤길문, 오이근씨는 1929년에 사망했으므로 국민동원령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따라서 자발적인 노동이민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기서 ‘자발적’이란 용어는 ‘강제적’의 상대어로 쓰인 것일 뿐, 당시의 현실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첫째는 한일 합방 직후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때문이었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지주와 소유권을 강화하고 소작인의 소작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땅이 없는 소작인들의 농업 종사는 더욱 어려워졌고 생활은 피폐해졌다.

1920년 조선인 농가 중 자영농이 23%, 반자작이 37%, 소작농이 40%였던 것이 1940년이 되면 각각 18%, 23%, 59%로 바뀌었다. 이렇게 몰락한 농민들은 농촌에서 과잉인구로 집적되어 소작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는 악순환을 이루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국내의 도시빈민층을 형성하거나 산간벽지의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해외로 유출되었다.
둘째는 일제의 산미증산계획과 쌀의 반출이었다. 일제의 산미증산계획으로 조선의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일본으로 유출되는 양이 더욱 많아 조선의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때문에 이농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국내의 산업발전 수준이 낮아서 이들을 임금노동자로 수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의 상당수가 일자리가 있는 일본으로 떠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배출요인으로만 보아도 1910년대와 20년대 조선인의 도일 노동이민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반강제적인 성격이 짙었다. 다만 일제의 직접적인 강제는 아니더라도 일제의 정책으로 인한 간접적인 강제였던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1차대전(1914-1918년) 이후의 경기 호황기에는 일본의 노동력 유인력이 컸기 때문에 조선인의 도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1920년대말 세계가 불경기에 돌입했을 때, 일본의 일자리마저 쪼그라들었을때에는 조선인에게 미친 타격은 더욱 컸다. 1931년의 조선의 실업자 수가 3백만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 2천만명, 경제활동인구 1천2백만명 중에서 실업률이 25%에 달했던 극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도항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의 노동이민은 더욱 늘어났고, 시간이 갈수록 합법적 도항보다는 불법 도항이 늘어났다. 불법이주한 사람들은 관공서나 회사에 기록을 남길 수 없었고, 따라서 이들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공식 기록만 보더라도 경기불황으로 일본 내무성의 요청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1925년 8월 도항저지제를 실시했음으로 불구하고, 조선인의 도항자수는 1920년의 30,189명에서 1930년에는 298,091명으로 10배나 증가했다. 1935년에는 625,678명으로 다시 5년 만에 두 배로 늘었고, 1940년에는 1,190,444명으로 1백만명을 넘었으며, 1944년에는 1,936,843명으로 4년만에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일제강점기 후기에 조선인들의 생활고가 매우 심각했다는 뜻이다.

생활고에 쫓겨 도일한 이농 노동이민자들은 대개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상도, 제주도, 전라도 출신들이었다. 일본 내무성 경보국의 조사에 따르면 출신지가 알려진 1923년의 도항자 72,815명 가운데 경상남도 출신이 39%,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남도 출신이 25%, 경상북도 출신이 16%이었다. 일본 도항자의 80%가 이 세 지역 출신이었던 것이다.
친분관계도 노동이민자의 도일에 영향을 주었다. 1927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이주자의 73%가 친척 또는 친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았다. 1925년의 센서스에 따르면 경상남도 고성군의 인구는 약 8만7천명이었다. (*)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카라즈카 추도비] 20. 조선인 추도비 건립자들 (0) | 2022.01.18 |
|---|---|
| [다카라즈카 추도비] 19-5. 강제연행 피해자 신고서 조사의 한계 (0) | 2022.01.16 |
| [다카라즈카 추도비] 19-3. 경남 고성군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0) | 2022.01.16 |
| [다카라즈카 추도비] 19-2. 경남 고성 군청의 자료연구사 (0) | 2022.01.16 |
| [다카라즈카 추도비] 19-1. 경남 고성, 공룡의 고향 (0) | 202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