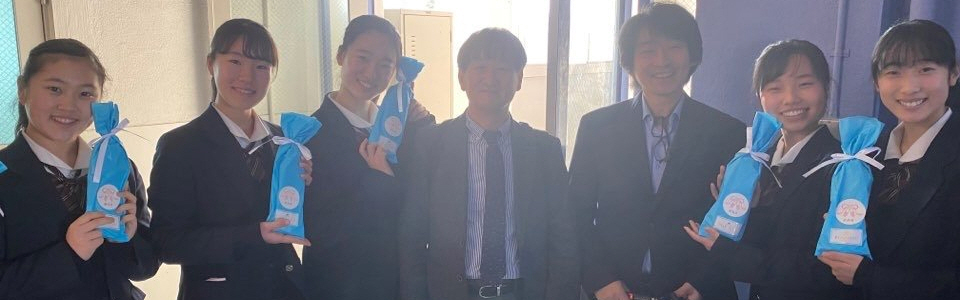<군대환>을 타고 제주에서 오사카로 건너온 제주인들은 대부분 이카이노에 모여 살았습니다. 1973년 이카이노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이쿠노로 바뀌었는데, 이는 주변의 일본인들이 조선인 빈민촌 때문에 땅값과 집값이 떨어진다고 탄원했기 때문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카이노의 조선인 빈민촌은 돼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2세기에 백제 도래인들도 이곳에서 돼지를 치며 살았지만, 그때는 그나마 왕실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특수산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의 제주인들은 생계 보조 방편으로 돼지를 키웠습니다.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다큐멘터리 <쓰러지지 않는 부당(2019, 최아람 감독)>에서 재일동포 2세 배영애씨는 1929년에 일본에 건너온 부모님은 숯을 구워 팔면서 집에서 돼지를 키워 생계를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위의 일본인들이 “돼지 냄새 난다”며 멀리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카이노 조선인들이 돼지를 키우던 이야기는 이민진의 <파친코>에도 나옵니다. 선자가 남편 이삭과 함께 부산을 떠나 시모노세키에 도착하고, 기차로 오사카에 내리자 이삭의 형 요셉이 이카이노로 두 사람을 안내하는 장면입니다.
“일행은 조선인들이 사는 빈민가 이카이노에서 내렸다. 요셉이 사는 동네는 전철 안에서 본 멋진 길이나 풍경과 전혀 다른 곳이었다. 동물 냄새가 음식 냄새는 물론 화장실 냄새보다도 더 지독하게 났다. 선자는 코와 입을 가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동물 냄새란 돼지 냄새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선자의 남편인 이삭의 형 요셉의 말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요셉과 경희는 지붕이 약간 뾰족한 상자 같은 오두막집에 살았다. 오두막집의 나무들은 골이 진 강철로 덮여 있었다. 금속 덮개가 있는 합판이 현관문이었다. ‘이곳은 돼지들과 조선인들만 살 수 있는 곳이야.’ 요셉이 웃으며 말했다.”

이 집에서 선자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살림은 점점 나아지지만 이카이노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초기의 이카이노를 서술한 이민진 작가의 기술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카이노는 잘못 만들어진 마을이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판잣집들은 모두 똑같이 값싼 자재들로 엉성하게 지어져 있었다. 현관 계단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거나 창문을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은 집도 군데군데 있었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다. 무광택 신문지와 타르지가 창문 안쪽을 덮고 있었고, 지붕에 사용된 금속은 녹슬어 있었다.
“집들은 거주자들이 값싼 자재나 주운 자재로 직접 지어 올려 오두막이나 텐트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시로 만든 강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봄날치고는 따뜻한 저녁이었다. 넝마를 반쯤 걸친 아이들은 술에 취해 골목에서 잠든 남자를 무시한 채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요셉의 집에서 멀지 않은 현관 계단에서는 어린아이가 변을 보고 있었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조선동포들이 모여 살았던 이카이노의 처참한 모습이 담담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재미동포 이민진씨가 재일동포들이 반세기 전에 살았던 이카이노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취재했는지 궁금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된 노동상황을 견뎌내야 했던 조선동포들의 삶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신산했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은 <제주 청춘가>라는 유행가의 가사를 바꿔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시름을 달래곤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말을 그대로 따서 옮겼습니다.)
“무정한 군대환은 무사 날 태워 완, 이 추룩 고생만 시켬신고/ 청천 하늘엔 별도 많치만, 내 몸 위에는 고생만 많구나./ 이 몸은 이 추룩 불쌍허게, 일본 어느 구석에 댁겨지고/ 귀신은 이신건가 어신건가, 날 살리잰 올건가 말건가/ 나신디 날개가 이서시문 나랑이라도 가구정 허건만,/ 날개가 어신 것이 원수로다.” (*)
'우리학교 무용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학교 무용신] 21. 이카이노와 제주도의 현대사 (0) | 2023.01.08 |
|---|---|
| [ウリ學校舞踊靴] 20. <パチンコ(2017)>の猪飼野 (0) | 2023.01.08 |
| [ウリ學校舞踊靴] 19. 「君が代丸」 vs. 「伏木丸」 (0) | 2023.01.07 |
| [우리학교 무용신] 19. <군대환> vs. <복목환> (0) | 2023.01.07 |
| [ウリ學校舞踊靴] 18. <君が代丸>に対する済州人の記憶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