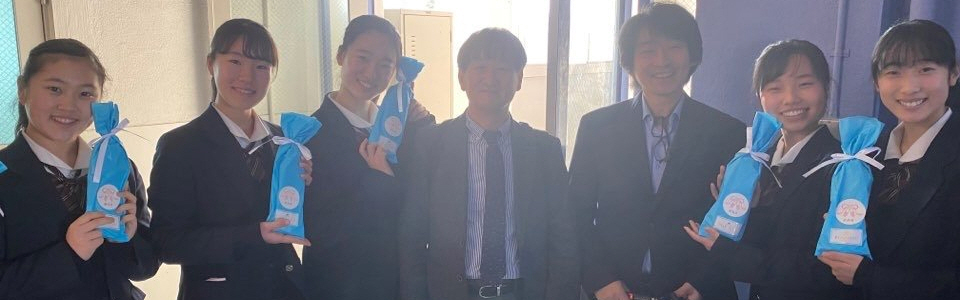자료를 통해 살핀 <남대문역 끽다점>은 ‘끽다부’보다는 ‘식사부’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이곳의 요리가 비싸고 고급이라는 사실이 일반인과 미디어의 주목을 끌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경성역 끽다점>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 우선 박태원의 중편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에는 경성역 끽다실 에피소드를 보자.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게다. ... 문득 한 사내가 ...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 그는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루삐스(칼피스), 그리고 구보를 향하여, 자네도 그걸루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이 작품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소시민적 지식인의 무기력한 일상과 정신적인 방황을 읽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 장면을 통해서는 당시 <경성역 끽다점>의 위치와 메뉴, 그리고 종업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즉, <경성역 끽다점>은 1층의 복잡한 3등 대합실에서 뚝 떨어진 ‘2등과 1등 대합실’ 곁에 위치해 있었고, 종업원은 ‘소녀’였으며, 메뉴로는 커피와 홍차뿐 아니라 칼피스 등의 주스 종류도 구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상의 <날개(1935)>에는 주인공이 경성역을 두 번 방문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첫 번째는 커피를 마시러 갔으나 가진 돈이 없어 돌아서는 장면이었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 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으로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 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박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뜩하였다.”
이 장면은 끽다실에 이르기도 전이므로 커피를 판다는 점을 제외하면 끽다점에 대해 더 알려주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경성역 끽다점이 왠만한 액수의 돈이 필요한 비싼 곳임을 암시해 주기는 한다. 두 번째 방문에서 주인공 ‘나’는 경성역 끽다점의 한 박스 좌석을 차지하고 영업이 종료될 때까지 머무른다.
“경성역 일,이등 대합실 한켵 티이루움에를 들렀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 나는 한 복스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 서글프다. 그러나 내게는 이 서글픈 분위기가 거리의 티이루움들의 그 거추장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절실하고 마음에 들었다. 이따금 들리는 날카로운 혹은 우렁찬 기적 소리가 모오짜르트보다도 더 가깝다.
“나는 메뉴에 적힌 몇 가지 안 되는 음식 이름을 치읽고 내리읽고 여러 번 읽었다. ... 거기서 얼마나 내가 오래 앉았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객이 슬며시 뜸해지면서 이 구석 저 구석 걷어치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닫는 시간이 된 모양이다. 열 한 시가 좀 지났구나, 여기도 결코 내 안주의 곳은 아니구나, 두루 걱정을 하면서 나는 밖으로 나섰다. 비가 온다.”

이 장면에서 이상은 ‘끽다점’이라는 일본식 한자어 대산 ‘티룸’이라는 서양식 외래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다. 또 앉은 좌석을 ‘복스’라고 한 것을 보니 이 끽다점에는 홀의 오픈 테이블뿐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다소 격리된 박스 좌석도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곳은 주인공이 서글픔을 느낄 정도로 손님이 자주 바뀌는 곳이며, 모차르트 등의 서양식 고전 음악을 틀어주고 있었고, ‘치읽고 내리읽’을 수 있을 만큼 제법 긴 목록의 메뉴판이 구비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밤 11시면 영업을 종료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이상의 <날개>를 통해 경성역 끽다실의 분위기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신문과 잡지가 대체로 복잡하고 화려하고 비싸고 고급진 곳으로 묘사하곤 했던 <경성역 끽다점>이 작가들의 눈에는 쓸쓸하고 서글프고 상실감을 안기는 곳으로 비쳐졌던 것을 알 수 있다. (*)
'조정희PD의 최승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카듀를 찾아서] 2-7. 최승희의 무용 유학과 <경성역 구내식당> (0) | 2021.07.03 |
|---|---|
| [카카듀를 찾아서] 2-6. 강우규 의사와 <남대문역 끽다점> (0) | 2021.07.03 |
| [카카듀를 찾아서] 2-4. <남대문역 끽다점>의 커피 가격 (0) | 2021.07.02 |
| [카카듀를 찾아서] 2-3. 경성역의 <구내식당>과 <끽다실> (0) | 2021.07.02 |
| [카카듀를 찾아서] 2-2. <다리야>에 8년 앞선 <남대문역 끽다점> (0) |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