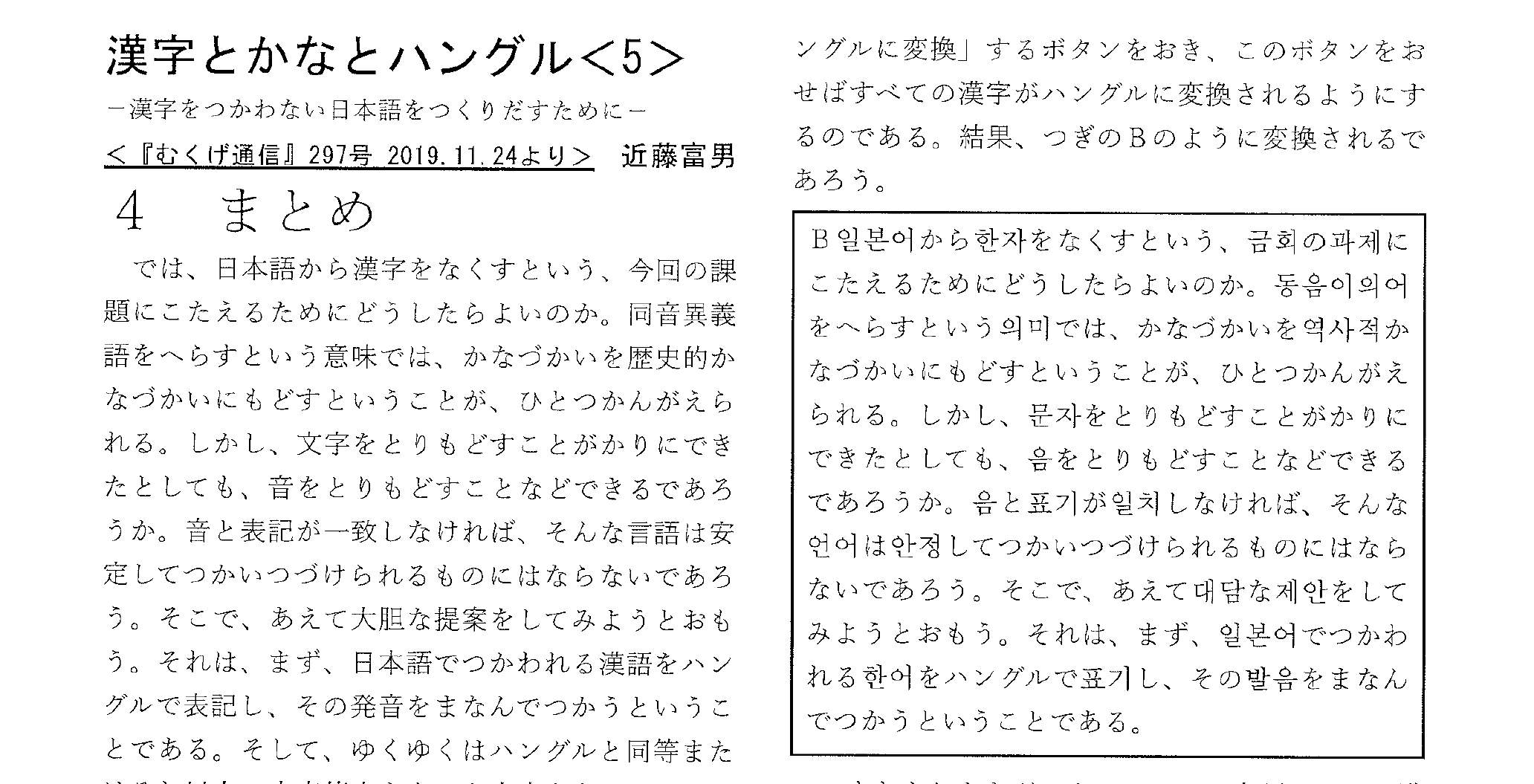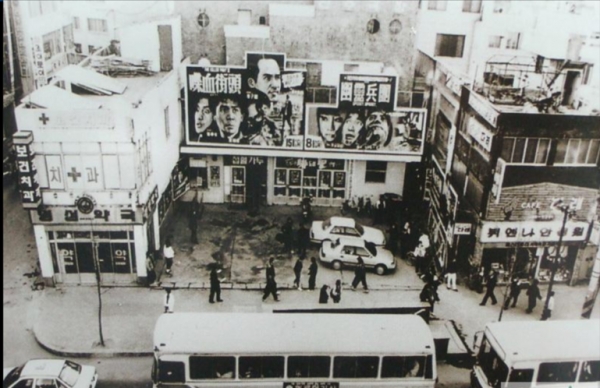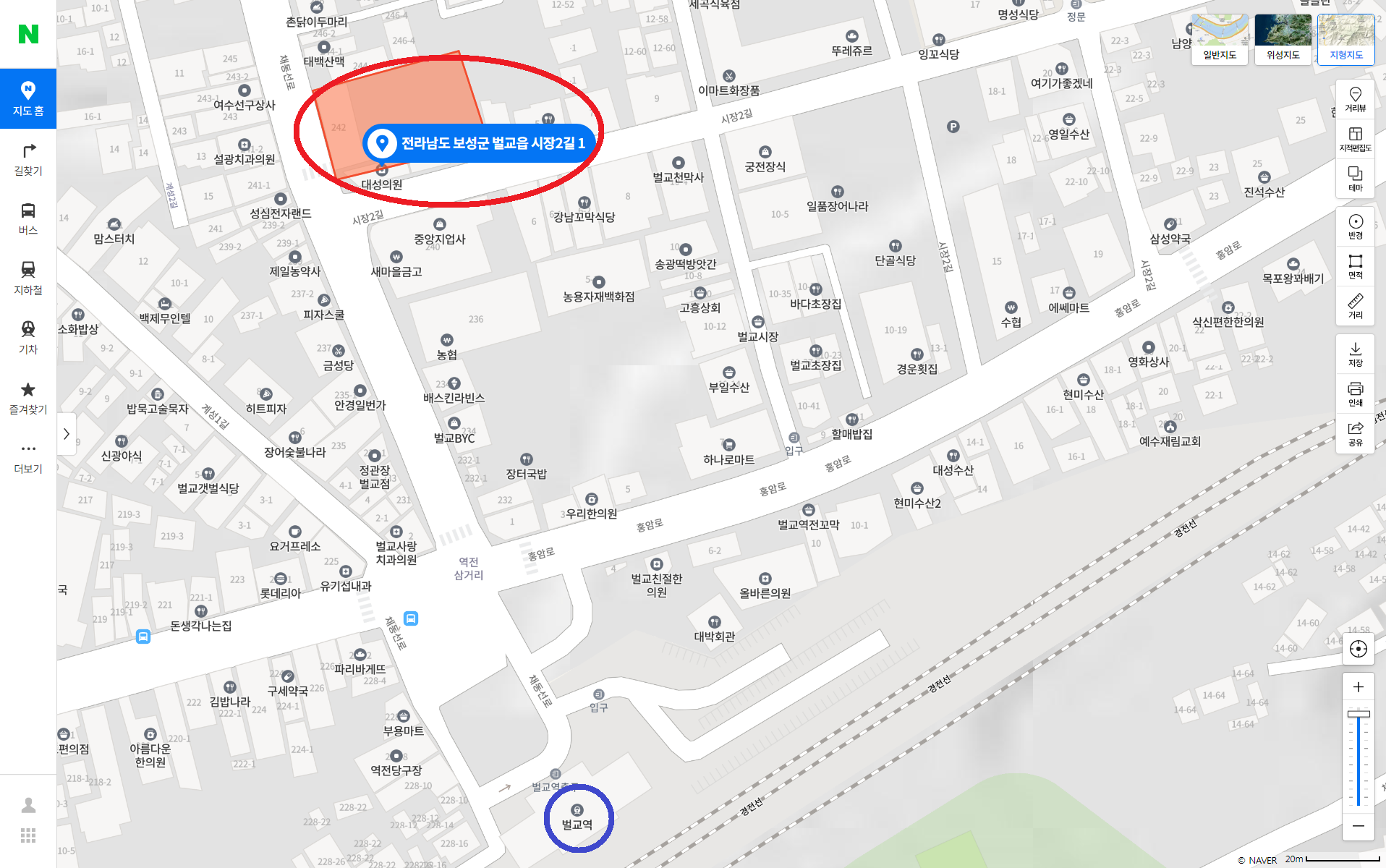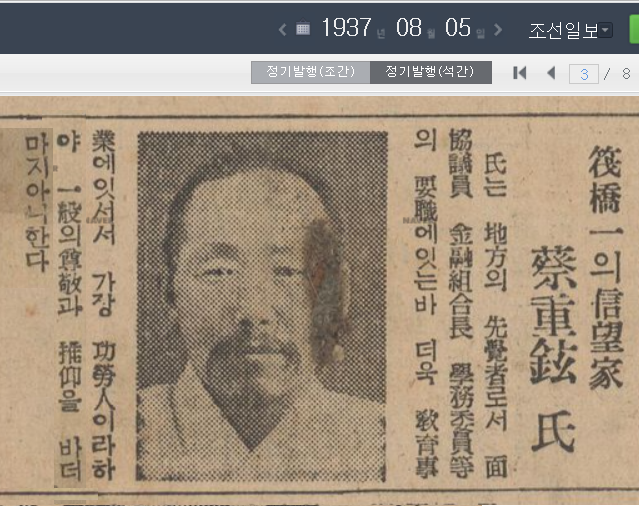<宝塚朝鮮人追悼碑>は私に深い感動を与えた。 この追悼碑を建立するために20年の努力を傾けた近藤富男先生、そして犠牲者のために100年以上祭祀を行ってきた日本人と在日同胞に尊敬の念も湧いた。
近藤先生が私に犠牲者たちの韓国内の縁故を探してほしいと頼んだ時、ためらうことなく承諾したのもそのためだった。 犠牲者5人に対する憐憫の気持ちとともに、この方々を祭祀し追悼碑まで建てた方々に感謝の気持ちを示したかったのだ。
犠牲者金炳順(キム·ビョンスン)氏の故郷が江原道江陵であることが文献で確認されると、私は江陵市に請願を出した。 追悼碑の建立者に感謝牌を贈呈してほしいという請願だった。 これは無念な死を受けた金炳順氏を記憶する方法であるだけでなく、金炳順氏の犠牲が忘れられないように努力した日本人と在日朝鮮人に対する最小限の礼儀だと考えた。

この請願に大勢の人が参加した。 韓国<チームアイ>の鄭澈勲(チョン·チョルフン)先生、写真作家の安海龍(アン·ヘリョン)先生も参加し、金性洙(キム·ソンス)記念事業会の洪眞善(ホン·ジンソン)理事長、ネットピアの柳善起(ユ·ソンギ)社長、國立江陵原州大学の姜承昊(カン·スンホ)教授など、江陵の活動家たちも参加した。 特に金炳順氏の系図を捜し出して彼の江陵ゆかりを明らかにする手がかりを発掘してくれた江陵慶州金氏宗親会の金子正(キム·ジャジョン)、金喆旭(キム·チョルウク)先生も請願に参加し、日本でも兵庫県の鄭世和(チョン·セファ)、大黑澄枝先生が共にしてくれた。
この請願は江陵市議会を経由して江陵市役所に受け付けられ、請願内容の確認を経て受け入れられた。 感謝牌贈呈の対象も8人に決まった。 日本人6人(近藤富男、飛田雄一、堀内稔、玉野勢三、足立泰教と足立智教夫妻)と在日朝鮮人2人(鄭鴻永、金礼坤)だった。
江陵市庁が請願を迅速に受け入れてくれたのは、請願内容が意味があるという判断のためだっただろうが、そこには近藤富男先生の健康が悪化したのも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 請願書を出す頃の2021年11月に近藤先生が病院から6ヶ月余りの時限付き人生を宣告されたためだ。

感謝牌の贈呈が決まったのは2022年1月末だった。 東京所在の江原道代表部のカン·ビョンジク本部長とムン·ミヒョン部長が直接宝塚を訪問し、請願内容を確認した直後だった。 以後、カン·ビョンジク本部長は江陵市庁のパク·ジョンシ、イ·ジュンハ、パク·インスン係長などの実務陣と協力して迅速に感謝牌が渡されるよう努力した。
江陵市長キム·ハングン名義の感謝牌は2022年3月26日に渡されることに決定されたが、突発変数が生じた。 近藤先生の健康が悪化し始めたのだ。 焦った請願者と実務者たちは感謝牌の伝達が決定されるやいなや製作を急いだが、近藤先生の容態は急速に悪化した。 江陵市庁の担当公務員たちは近藤富男先生のための感謝牌を先に製作して送ることにしたが、それでも時間が足りないようだった。
結局、江陵市庁のパク·インスン係長は近藤富男先生の感謝牌が完成するやいなや、これを写真に撮ってカン·ビョンジク本部長と私に送ってくれ、私はこの感謝牌の写真を鄭世和先生を通じて近藤先生に渡されるようにした。 昏睡状態が続いた近藤先生は、しばらく気がついた間に感謝牌の写真を見た後、息を引き取ったという。 残念なことだが、幸いだった。 他の7名様への感謝牌は予定通り3月26日に渡された。

日本には良心的な学者や活動家が少なくない。彼らは韓日関係がどちらかの自尊心を傷つけず、共生と協力関係に発展することを願う。 近藤富男先生がまさにそのような方々の一人だった。
大韓民国の地方政府が韓国を愛する日本人活動家たちに公式に感謝を表明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と話した。 近藤富男先生が生前にそのような感謝を受けて亡くなったのは残念な状況でも幸いだと思っている。 (継続)
'다카라즈카 조선인 추도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콘도 도미오 선생님을 생각하며 (4) 정홍영과 콘도 도미오 (0) | 2022.06.27 |
|---|---|
| 콘도 도미오 선생님을 생각하며 (3) 강릉시의 감사패 (0) | 2022.06.26 |
| 近藤富男先生を想って(2)〈ティムアイ〉の創立者 (0) | 2022.06.26 |
| 콘도 도미오 선생님을 생각하며 (2) <팀아이>의 창립자 (0) | 2022.06.26 |
| 近藤富男先生を思いながら(1): <むくげ通信>の訃報 (0) | 2022.06.25 |